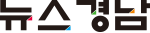빗물여인숙

비 그친 뒤,
바늘 끝 같은 여정들 모였다
움푹한 곳이면 다 마음이고 집이라는 듯
어느 집 처마끝도 늦가을 바르르 떠는 바람도
딱 하루만 동숙同宿이다
- 박해람 시인
***
저 작은 움푹 파인 웅덩이를 제 마음이라고, 집이라고 여기고 의탁하려는 심정이 오죽한가. 바르르 떠는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할 것인데 딱 하룻밤 동숙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빗물여인숙이 눈물겹다.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이웃의 소외받는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다. 딱딱한 시멘트바닥 같은 사회 인심이 저 눈물 같고 한숨 같은 순간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, 닦아줄 수 있다면 그래서 날이 밝고 따뜻한 햇살이 비춘다면 등이 배기던 바닥이 든든한 배경으로 바뀔 텐데. 나무 한 그루 살지 못하는 헐벗은 민둥산은 조금만 비가 와도 흘러내려 산사태를 내고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변한다. 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는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. 아름다운 숲도 나무 한 그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, 각양각색의 나무와 풀과 꽃들이 어우러져서 비로소 아름답고 건강한 숲이 되지 않는가.
글. 이기영 시인
◇ 이기영 시인은 (현) 한국디카시인협회 사무총장과 한국디카시연구소 사무국장이다.
< 뉴스경남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, 무단전재·크롤링·복사·재배포를 금합니다.>
김효빈 기자
edit07@newsgn.com